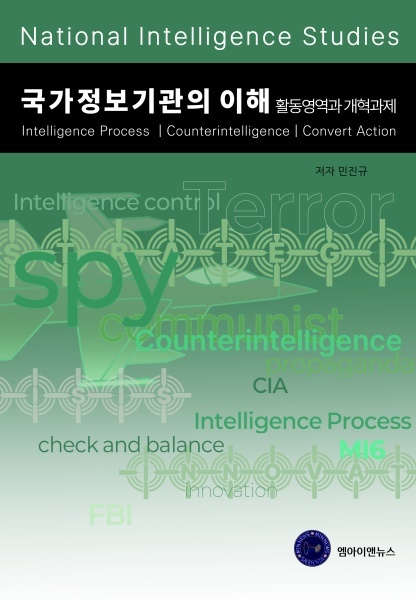[특집-정보기관 활동] 03. 미국 정보기관의 암살공작 금지 논란... 무차별 '암살공작'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성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공작은 처참히 실패,,, 미국 CIA는 쿠바 카스트로 서기장 암살공작을 900회 이상 수행
2020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부(SVR), 국방부 정보총국(GRU) 등에서 암살공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원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젠렌스키의 암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러시아 특수부대를 지속 투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모집한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암살을 피하려면 폴란드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공작을 활발하게 펼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쿠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서기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만 900회가 넘는 공작을 단행했다. 1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암살공작은 국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978년 'National Intelligence Reorganization Reform Act'를 제정해 정보기관의 암살공작활동을 금지했다.
2001년 9·11테러 이전까지 유지되던 암살공작에 대한 규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해제됐다. 테러의 도구가 인간(human)이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였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7년 4월 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무차별 '암살공작'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성공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는 크게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비밀공작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공작활동은 ‘적성국이나 상대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행위’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선전공작활동에서부터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암살공작까지 다양하다. 절대 발각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일반인에게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 비밀공작 중에 암살공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미국은 현재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공화당 강경파가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해 관련국과 직접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수많은 이슬람교도를 테러 혐의자로 분류했으며 일부를 체포해 쿠바의 콴타나모(Guantanamo) 감옥, 유럽의 비밀감옥 등에 불법적으로 감금했다. 혐의자에 대한 가혹한 심문법 등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비화됐다.
미국이 테러의 배후자로 알 카에다(al-Qaeda )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지목하면서 그는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다. 알 카에다는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발 테러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됐다.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고 있다고 믿은 미국은 그의 신병 인도를 아프간 정부에 요청했고 탈레반 정권은 이를 거절했다.
1998년 8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지 못했다.
알 카에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2001년 9・11테러를 감행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당시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전쟁의 목적이 빈 라덴을 죽이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빈 라덴의 암살이 미 정부의 암살공작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쿠바 피델 카스트로(Fidel Alejandro Castro) 서기장 암살의 실패로 여론이 나빠지자 1976년 정보기관의 암살공작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물론 공식적으로 중앙정보국(CIA)의 암살공작이 중단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수행됐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고상하게 인권과 공정한 법 집행을 주장하던 미국의 인품도 신출귀몰(神出鬼沒)한 세기의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다.
이제 미국 정부는 체면을 구기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법 해석까지 바꿨다. 미 국가안보위원회 법률가들은 ‘미국은 법적으로 테러리스트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빈 라덴의 기반 시설은 테러리스트, 즉 인간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 주요 테러리스트의 목에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체포 혹은 살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무법천지를 그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다.
세계의 어떤 인권단체도 이런 미국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전 세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테러리스트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국가마다 형법이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만 현상금을 걸고 암살을 목표로 추적하는 야만적인 행동을 벌이지는 않는다.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라는 직업이 있는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재 미국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테러를 옹호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누구도 나서기 어렵다.
더불어 어떤 인권운동가도 어떤 국가도 미국 정부에 대해 암살행위 금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상식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무리한 방식을 활용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나 연극의 제목으로도 많이 사용됐던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을 새겨보기 바란다.
국제법이나 국제 윤리라는 것이 강대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현실인 마당에 강대국이 되는 길만이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 계속 -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부(SVR), 국방부 정보총국(GRU) 등에서 암살공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원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젠렌스키의 암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러시아 특수부대를 지속 투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모집한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암살을 피하려면 폴란드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공작을 활발하게 펼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쿠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서기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만 900회가 넘는 공작을 단행했다. 1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암살공작은 국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978년 'National Intelligence Reorganization Reform Act'를 제정해 정보기관의 암살공작활동을 금지했다.
2001년 9·11테러 이전까지 유지되던 암살공작에 대한 규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해제됐다. 테러의 도구가 인간(human)이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였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7년 4월 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무차별 '암살공작'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성공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는 크게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비밀공작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공작활동은 ‘적성국이나 상대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행위’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선전공작활동에서부터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암살공작까지 다양하다. 절대 발각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일반인에게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 비밀공작 중에 암살공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미국은 현재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공화당 강경파가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해 관련국과 직접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수많은 이슬람교도를 테러 혐의자로 분류했으며 일부를 체포해 쿠바의 콴타나모(Guantanamo) 감옥, 유럽의 비밀감옥 등에 불법적으로 감금했다. 혐의자에 대한 가혹한 심문법 등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비화됐다.
미국이 테러의 배후자로 알 카에다(al-Qaeda )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지목하면서 그는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다. 알 카에다는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발 테러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됐다.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고 있다고 믿은 미국은 그의 신병 인도를 아프간 정부에 요청했고 탈레반 정권은 이를 거절했다.
1998년 8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지 못했다.
알 카에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2001년 9・11테러를 감행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당시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전쟁의 목적이 빈 라덴을 죽이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빈 라덴의 암살이 미 정부의 암살공작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쿠바 피델 카스트로(Fidel Alejandro Castro) 서기장 암살의 실패로 여론이 나빠지자 1976년 정보기관의 암살공작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물론 공식적으로 중앙정보국(CIA)의 암살공작이 중단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수행됐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고상하게 인권과 공정한 법 집행을 주장하던 미국의 인품도 신출귀몰(神出鬼沒)한 세기의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다.
이제 미국 정부는 체면을 구기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법 해석까지 바꿨다. 미 국가안보위원회 법률가들은 ‘미국은 법적으로 테러리스트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빈 라덴의 기반 시설은 테러리스트, 즉 인간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 주요 테러리스트의 목에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체포 혹은 살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무법천지를 그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다.
세계의 어떤 인권단체도 이런 미국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전 세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테러리스트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국가마다 형법이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만 현상금을 걸고 암살을 목표로 추적하는 야만적인 행동을 벌이지는 않는다.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라는 직업이 있는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재 미국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테러를 옹호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누구도 나서기 어렵다.
더불어 어떤 인권운동가도 어떤 국가도 미국 정부에 대해 암살행위 금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상식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무리한 방식을 활용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나 연극의 제목으로도 많이 사용됐던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을 새겨보기 바란다.
국제법이나 국제 윤리라는 것이 강대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현실인 마당에 강대국이 되는 길만이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 계속 -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